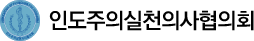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라는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참언론 참소리 213> 『영남시론』영남일보 2004년 7월 24일 토
소비의 덫김진국(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비평팀장)
요즘 모든 언론매체의 경제면은 갈수록 구두쇠로 변해 가는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걱정하는 기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부의 관심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게 만들까에 모아져 있는 듯한데, 당장 하루 끼니가 걱정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고 코앞의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에서 자신의 소비취향을 충족시키며 느긋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열려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채워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 서민들의 지갑에서 당분간 돈이 풀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신용카드 하나만 믿고 소비의 바다에 덤벙 빠져들었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소비의 대가는 가혹하고 처참했지만 소비의 열매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가져갔고, 국민들을 소비의 바다로 등 떼밀었던 정책 책임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또 다시 국민들을 소비시장으로 유혹해 낼 궁리만 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산다'는 말에 다소 식상함을 느낀 건지 영어의 위력을 빌려 '웰빙'이란 말로 포장된 새로운 소비생활을 추구하더니, 아무래도 국내 소비시장은 비좁고 너무 단조로운 탓인지 하나같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다.
그런데 좀처럼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단지 국민들의 구두쇠 심보 때문인 듯 분명히 선택의 의미가 담겨있는 소비란 말이 온 국민들의 의무인 것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 분위기다.
방송매체는 재고로 가득 찬 공장의 썰렁한 모습과 판촉활동에 나서는 영업사원들의 애처로운 표정들을 담은 화면으로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대고 있고, 정책 책임자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사주기 운동' 이나 '먹어주기 운동'을 펼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버팀목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대량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국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순환이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량폐기와 대량훼손이라는 중간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왔다. 폐기와 훼손의 양과 속도는 이미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 버린 지 오래다. 그 결과 우리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는 물론이요 숲그늘에서 잠시 뙤약볕을 피할 권리조차 빼앗겨 버렸다. 한 때 지천에 깔려 있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누릴 수 있었던 자연의 혜택이 지금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시장의 상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필수재조차 시장의 상품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모든 소득을 다 소비해버려도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는 소비의 덫에 갇힌 채 허덕이고 있다.
몇 십 년 간 일한 대가를 몽땅 털어 넣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제쳐두더라도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현실은 내팽개쳐 둔 채 정부는 오로지 국민들이 돈 쓰지 않는다며 울상만 짓고 있다. 최소한의 구매력도 없는 저소득계층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들이 돈만 펑펑 써 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소비심리 타령만 하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결과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터전이 소비상품의 대량폐기 과정에서 생겨난 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같은 독성물질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들의 몸도 소리없이 병들어가고 있다. 다음 세대의 삶이 가능할 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지금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지탱해 오던 경제의 치명적인 한계를 지켜보고 있다.